- 작성일 2025.05.12.
- 작성자 고대투데이
- 조회수 49

고려대학교 법학관의 한 강의실. 마이크가 고장 났다는 소식에 조교가 서둘러 장비를 가져온다. 교탁 앞에 선 교수는 아무렇지 않게 수업을 시작하고, 400여 명의 학생들은 조용히 집중한다. 심지어 의자 없이 서서 듣는 학생도 여럿. 이 강의엔 귀를 쫑긋 세우게 되는 무언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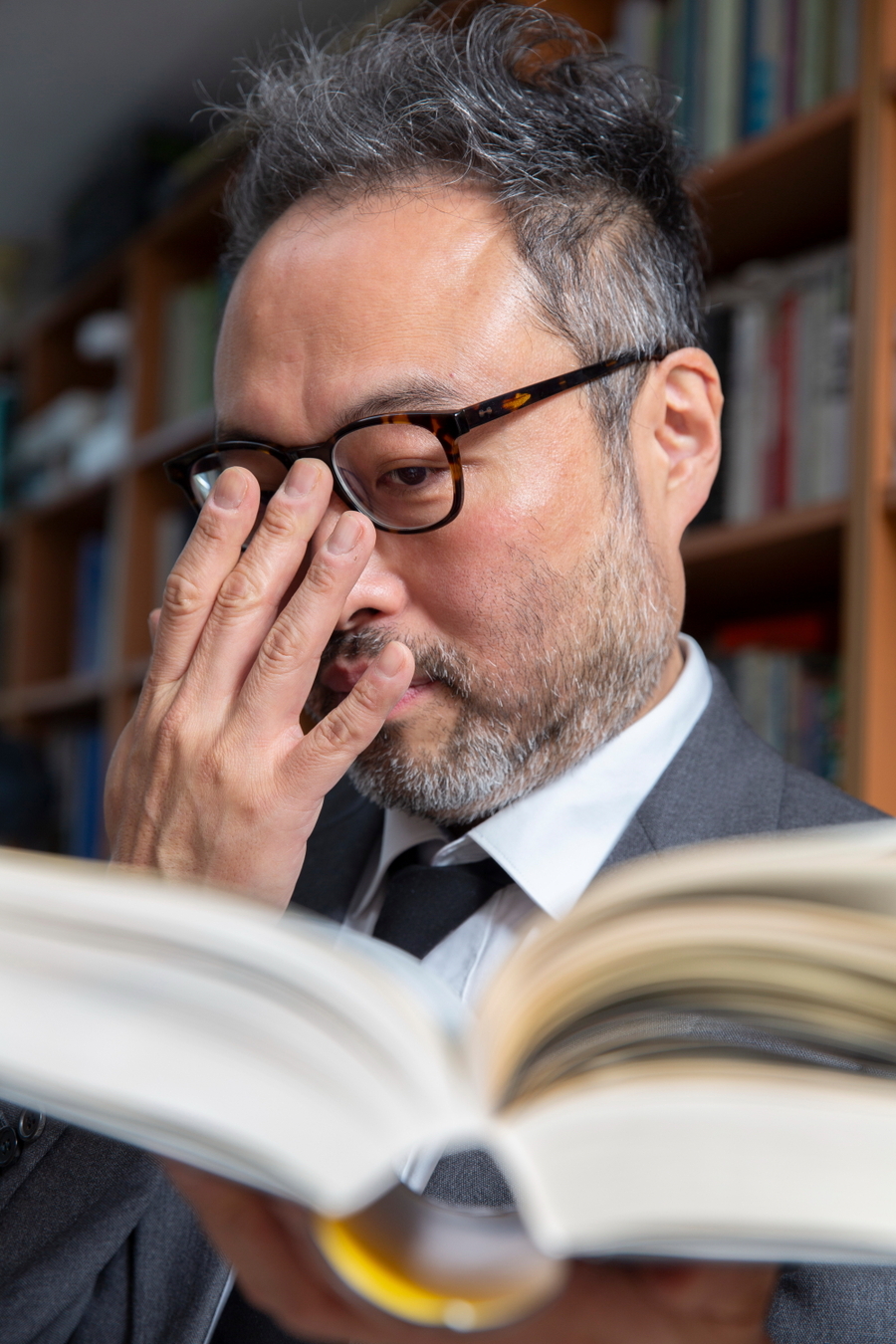
홍영기 교수의 수업은 수강신청하기 어려운 인기 강의다
‘범죄와 사회’라는 제목만으로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 수업은 단순한 법학 개론이 아니다. 법의 작동 원리와 현실의 어긋남 사이, 그 틈에서 질문을 던진다. 왜 어떤 범죄는 빠르게 해결되고, 어떤 범죄는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는가. 국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처벌하는가. 이 수업은 그 질문을 함께 붙잡고 고민하는 시간이다.
강의실은 늘 만석이다. 수강 신청 때부터 ‘피 튀기는 경쟁’이라는 이 수업. 서유정 학생은 “승부욕이 생겨 수강하게 됐다”며, “형사정책 개념이나 범죄 연구 방식을 실제 사례와 엮어 설명해 줘서 흥미롭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온 유학생 하연비 씨는 “한국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이 수업이 '신청하기 어렵지만 정말 재밌다'고 입소문이 났다”고 했다.
수업 중엔 종종 역할극이 펼쳐진다. 법적 쟁점이 있는 상황에 대해, 교수는 마치 연극을 하듯 양측 입장을 오가며 설명한다. “교수님의 말투도 유쾌한데, 진짜 포인트는 수업이 끝나도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친구랑 ‘그건 어떻게 생각해?’ 하고 얘기하게 되거든요.” 오승수 학생의 말이다.

생각을 붙잡게 만드는 ‘진짜 수업’
이런 수업 방식이 특별한 이유는, 홍 교수가 노트북 필기를 권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 수업은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수업입니다.” 시험은 OMR 카드로 치르지만, 책만 읽어서는 풀 수 없다. 수업 시간에 나눈 이야기들, 사례들, 학생들이 직접 던졌던 질문들이 문제의 핵심이 된다.
강의를 듣는 학생 중 법학 전공자는 한 명도 없다. 그럼에도 수강생들은 수업을 들으며 법학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을 점점 키워나간다. 정재훈 학생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법을 마주할 일이 많진 않겠지만,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은 분명히 있다”며 “교수님이 그걸 어렵지 않게 짚어주시는 것 같아 남은 수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범죄와 사회’는 교내 우수 강의에 수여하는 석탑강의상을 이미 여러 차례 수상했다. 많은 학생이 이 수업을 ‘명강의’라고 부르는 건 단지 법을 잘 설명해서가 아니다. 홍 교수의 강의는 형법을 다루되, 제도보다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법의 규범을 짚으면서도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고민을 함께 바라보기 때문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시기에, 그 질문 자체를 진지하게 꺼내주는 드문 수업이기도 하다.

'법'에서 '삶'으로
“고려대 학생이라면, 계산기 두드리기 전에 먼저 손을 뻗을 줄 아는 사람, 당장 불편하더라도 마땅한 일을 피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고려대의 풍모 같더라고요.”
학부 시절, 홍 교수는 오히려 법학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했다. 다른 수업을 청강하고, 전공 밖의 책들을 읽으며 방향을 고민하던 끝에, 대학원에서 법을 ‘사회의 언어’로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고 한다. “법학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싶었던 그 경험은, 지금의 수업을 만든 출발점이 됐다.
원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었지만, 교양 과목으로 열게 되면서 그는 “전문적인 내용을 어떻게 쉽게 풀어야 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요즘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젊을 때 어떤 경험이든 많이 쌓으세요. 적금보다 여행, 연애, 공연이나 전시 관람 등 안 해본 걸 해봐야 나중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선택할 수 있어요.”
법학이라는 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나갈 땐 삶의 방향에 대한 힌트를 얻어가는 강의. 그래서 이 수업은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는다. 수업을 듣고 법학에 흥미를 느껴 로스쿨에 진학한 학생도 있고, 처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고민하게 됐다는 후기도 많다. 괴짜 같지만 날카롭고, 느슨해 보이지만 치밀한 수업. '범죄와 사회'가 바로 그런 수업이다.